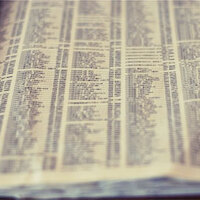남자라면 열혈이다
패밀리가 비록 8비트 게임기이기는 하나 사실 전설적인 게임이 많았다.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그렇고 ‘에닉스’의 드래곤 퀘스트가 좋은 예다. 이 둘은 나중에 게임계의 큰 획을 긋는 대작인데 이후로 계속적으로 시리즈가 출시되어 전설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처럼 잘 찾아보면 대작의 시초이거나 괜찮은 작품이 패밀리에 많았는데 특히 ‘게임은 협동이다’를 보여준 작품이 있으니 바로 ‘열혈 시리즈’였다.
패밀리를 가졌던 유저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하고 패밀리의 대중적인 게임이었다. 일단 친구와 함께 2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들이 열광하기에는 충분했다. 물론 기존에 2인 플레이가 되는 게임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인 플레이기는 하나 먼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 받는 식의 게임이 많았다. 2인용이기는 하나 협동적인 모습은 없던 것이다. 물론 전설의 슈팅게임인 ‘트윈비’나 ‘배틀시티’ 같이 게임이 있긴 했으나 협동이라 긴 보단 같이 한다(?) 정도의 느낌이었다. 같이하는 친구가 적의 총알을 피할 수 있게 도와 줄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열혈 시리즈는 찐한 우정을 체험할 수 있기 충분한 작품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열혈 격투전설’의 경우 열혈 시리즈의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 무술을 겨루는 게임(사실 무술이라기 보단 그냥 패싸움 같았다)이었다. 2인 플레이시 나와 친구가 한 팀이 되어 함께 상대방을 물리쳐야했다. 친구가 맞고 있으면 달려가 롤링어택을 날려주고, 내가 맞고 있을 땐 친구가 달려와 니킥을 날려주고는 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우정이었다.
캐릭터 고르는 방식도 특이 했다. 이름과 생일, 혈액형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졌고, 무술의 종류가 달라졌다. 그래서 주로 좋은 무술과 능력치가 나오는 생년월일과 혈액형은 외워두고는 했다. 나는 특히 마샬아츠를 사용하는 캐릭터를 좋아해 외워두고 사용했는데 검정 도복바지를 입고 발차기를 샤샤샥 날리면 이소룡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최고였다.
열혈 시리즈엔 ‘쿠니오’와 ‘리키’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모든 시리즈엔 꼭 나왔다. 흡사 김성모 만화에서 ‘강건마’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김성모의 만화에서는 강건마는 어떤 작품에 나오던 킹왕짱 쌔지만 열혈 시리즈는 아니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쿠니오와 리키가 제일 후졌다. 웬만하면 주인공이 제일 쌜 법도 한데 별로 특징도 없고 그렇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도 거의 골라본 적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스토리 모드를 하다보면 이 녀석들을 플레이하게 되는데 하는 동안 내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쿠니오와 리키의 우정만큼은 최고였다.
위에서 말한 대로 열혈은 시리즈물인데 열혈격투전설 빼고도 ‘열혈’이라는 이름을 붙친 온갖 스포츠가 존재했다. 열혈하키, 열혈축구, 열혈농구, 그리고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열혈신기록.(우리는 주로 열혈 운동회라 불렀다) 이밖에도 많지만 내가 주로 한 것은 이것들이었는데 모두다 깨알 같은 재미와 협동이 존재했다.
열혈시리즈가 협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모든 시리즈엔 폭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단 ‘열혈’이란 단어가 붙은 이상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을 상상하면 큰 오산이다. 열혈하키의 경우 하키채로 패는 것도 모자라 그냥 주먹도 휘두를 수 있었다.
특히 마구를 쏘기 위해선 대략 3초가량 슈팅 버튼을 눌러 기를 모아서 쏴야 했는데 기를 모으는 3초가량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초반 한두 판의 경우 컴퓨터가 좀 모자라 기를 모으는 동안에도 잘 건드리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인공지능도 좋아져 기를 모은 다 싶으면 하키채 찜질을 받기 일쑤였다.
이때 다시 한 번 뜨거운 우정이 빛을 바라는데 기를 모으는 동안 내 친구는 슈팅을 방해하러 오는 상대방을 있는 족족 쳐 패고는 했다. 물론 내 친구가 마구를 위해서 기를 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뜨거운 우정이 아닌가? 친구의 마구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져 친구를 지킨다! 그 정신은 정말 휘트니 휘스턴 지키던 캐빈 코스터너 저리가라였다. 하여튼 ‘열혈’이란 단어가 붙은 이상 정상적인 스포츠는 아니었다.
열혈시리즈의 최고의 장점은 협동이라 말했지만 사실 최악의 단점(?)도 사실 협동이라는 점이었다. 협동이 되는 만큼 우정파괴의 위험도 도사렸다.
다른 시리즈도 비슷하지만 열혈 격투전설의 경우 상대 팀만 때릴 수 있던 게 아니라 같은 편도 타격이 가능했다. 쉽게 말해 내가 내 친구의 캐릭터도 팰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를 위기에 구하기 위해 날렸던 롤링어택이 상대팀과 함께 내 친구도 함께 날렸을 땐 욕설이 튀어나오기 딱 좋았다.
이게 심해지면 한명이 삐지고 “너랑 안 놀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락기 주인이 삐져 그만한다고 해버리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오고는 했다. 게임을 계속 같이 하기 위해선 주인장 녀석의 비위를 조금씩은 맞춰주고는 해야 했다. 어린 나이지만 사회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던 거 같다.
우정파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혈 시리즈는 이후 여러 게임기에 이식되고 했다. 그러나 패밀리만큼의 큰 빛을 보지 못했다.(물론 우정파괴 때문은 아니었다) 그래도 열혈남아(熱血男兒)가 아닌가? 키 작던 나도, 내 친구도 쿠니오와 리키 못지않게 열혈남아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남자라면 역시 열혈인 것이다.
written by 선의
이전 글 - [그 시절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것들] -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새턴 vol.6
'Ana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맥가이버 키드의 생애 (0) | 2013.01.01 |
|---|---|
| 아이템풀 (0) | 2012.12.26 |
| 스마트 폰과 전화번호부 (1) | 2012.12.14 |
| 나는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이다 (0) | 2012.12.11 |
| 부루마블은 현실이다 (0) | 2012.12.11 |